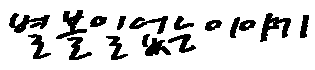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7년,
그땐 내가 컴퓨터가 아닌 플레이스테이션(1)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2007년 1월에 지금까지도 대작으로 회자되고 있는 명작
파이널 판타지 7탄의 완전 오리지널 원작이 플스로 발매되었던 때다.
그 뒤로 인터내셔널 판도 나오고, 피씨판으로도 나오고 했지만...
그때 파판 7의 등장을 보고 게임잡지나 그런 데서는 난리가 났었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영화라고...
그도 그럴 것이, 파판7은 내 기억으로는 제작비가 300억인가 얼만가 들었던
당시 게임 제작비로써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 투입된 그야말로 '대작'이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당시 최대였던 CD세장(윙커맨더 같은건 빼자-_-)의 볼륨에
주요 이벤트신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CG동영상에
(플스는 폴리곤 처리능력이 떨어져 이벤트 신에서는 대개 미리 녹화된 CG동영상이 나왔다)
영화와 같은 치밀한 구성의 스토리까지...
정말 그때에는 '인터렉티브 무비'라는 게 곧 현실로 다가올 것만 같았고
파판7이 그 이정표를 세웠다... 뭐 이런 잡지 기사도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만 하더라도 멀티플레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때라
난 당연히 게임이 앞으로는 정말 '내가 움직이는 영화'의 개념으로 발전할 줄 알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게임은 내가 생각했던 인터렉티브 무비의 개념보다는
스포츠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왜, 이제는 모두들 자연스럽게 E-스포츠라고들 말하지 않나.
'영화같은 게임'이란 건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냥 멋진 게임에 붙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스포츠의 개념으로 발전해서 서로 겨루는 형태의 게임,
물론 그것도 좋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난 지금도 영화처럼 스토리를 즐기며 내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영화같은 개념의 게임이 좋다.
그것이 내가 어디서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 카트보다는
집에서만 할 수 있는 패키지 게임을 더욱 좋아하는 이유이다.
카트에는 내가 이겨야 할 적만 있을 뿐,
내가 음미할 수 있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땐 내가 컴퓨터가 아닌 플레이스테이션(1)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2007년 1월에 지금까지도 대작으로 회자되고 있는 명작
파이널 판타지 7탄의 완전 오리지널 원작이 플스로 발매되었던 때다.
그 뒤로 인터내셔널 판도 나오고, 피씨판으로도 나오고 했지만...
그때 파판 7의 등장을 보고 게임잡지나 그런 데서는 난리가 났었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영화라고...
그도 그럴 것이, 파판7은 내 기억으로는 제작비가 300억인가 얼만가 들었던
당시 게임 제작비로써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 투입된 그야말로 '대작'이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당시 최대였던 CD세장(윙커맨더 같은건 빼자-_-)의 볼륨에
주요 이벤트신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CG동영상에
(플스는 폴리곤 처리능력이 떨어져 이벤트 신에서는 대개 미리 녹화된 CG동영상이 나왔다)
영화와 같은 치밀한 구성의 스토리까지...
정말 그때에는 '인터렉티브 무비'라는 게 곧 현실로 다가올 것만 같았고
파판7이 그 이정표를 세웠다... 뭐 이런 잡지 기사도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만 하더라도 멀티플레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때라
난 당연히 게임이 앞으로는 정말 '내가 움직이는 영화'의 개념으로 발전할 줄 알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게임은 내가 생각했던 인터렉티브 무비의 개념보다는
스포츠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왜, 이제는 모두들 자연스럽게 E-스포츠라고들 말하지 않나.
'영화같은 게임'이란 건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냥 멋진 게임에 붙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스포츠의 개념으로 발전해서 서로 겨루는 형태의 게임,
물론 그것도 좋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난 지금도 영화처럼 스토리를 즐기며 내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영화같은 개념의 게임이 좋다.
그것이 내가 어디서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 카트보다는
집에서만 할 수 있는 패키지 게임을 더욱 좋아하는 이유이다.
카트에는 내가 이겨야 할 적만 있을 뿐,
내가 음미할 수 있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SEASON 1 > 옛날 게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플레이스테이션(1)의 명작 RPG시리즈, 아크 더 래드 2 (1) | 2008.04.05 |
|---|---|
| 10년째 울궈먹히고 있는 스퀘어의 Final Fantasy 7 (0) | 2008.02.29 |
| 플레이스테이션 브랜드의 시작, 플레이스테이션(PSone) (4) | 2008.01.06 |
| 이제 온라인으로 등장하는 EZ2DJ (0) | 2007.12.14 |
| 파이널 판타지 7 : 크라이시스 코어를 즐기면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들 (1) | 2007.09.26 |
posted by drunken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