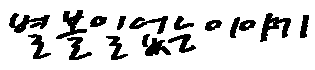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답지 않게 다이어리 쓰는 걸 즐겨했다.
(어렸을 때라 함은... 고등학교 때를 말한다-_-)
물론 초중딩 때 방학숙제로 내 주는 일기는 어김없이 밀려서
일기의 대부분을 시와 소설로 때우는 날림일기를 쓰곤 했지만
고등학교 때 손바닥만한 다이어리 붐이 불면서
거기다가 날마다 그날의 일상을 기록하는, 제대로 된 의미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었다.
사실. 손바닥만한 다이어리라는거 자체가 시커먼 남고딩보다는
여고딩들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이었던 데다가 거기다 일기를 쓰고
여러가지 잡스런 소리를 써 대며 '꾸민다'는 행위는 정말 남자고등학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딩때 쓰던 다이어리는
'남이 보면 안된다'는 일기장에 대한 불문률에도 불구하고
두루두루 돌려보며 즐기던(?)비운의 일기장이 되고 말았다.
그때 고등학생의 삶이란 게 워낙 단조로운 터라
지금 생각하면 무슨 쓸 말이 그리도 많았을꼬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각 수업 시간들마다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때 하던 풍물 동아리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작은 공간 안에 나름대로 알차게 적어 놓았었다.
(지금도 일기 부분은 가지고 있고, 가끔 서랍정리하다가 한번씩 꺼내 보곤 한다)
그때는 그래도 학교라는 틀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싫건 좋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일기를 쓰건 뭘 쓰건
'필기하는 행위'자체는 하루종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리 쓸 시간은 넘쳐났다.
야자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전혀 계획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학 1학년과 휴학생 생활을 보내고
군대에 가자 일기장 대신 '수양록'이란걸 줬다.
물론 지금에서야 수양록이 무슨 군내사고 발생시 수사자료로 활용된다느니 하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들어서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 잡지책만한 노트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에는 꽤나 반가웠었다.
물론 내 기대와는 달리 '일기'는 아니었고,
(수양록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2회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때처럼 쓸 시간이 풍부해서 날마다 그것만 쓰고 있을 수만도 없었다.
뭐 그래도 남들은 일병 되면 집어치운다는 수양록 작성을
병장 초기때까지 꾸준히 해 왔고
그것과는 별도로 집에서 보내온 작은 스케줄 수첩 같은 것에
정말 간단간단히 하루 일상을 적어보기도 했었다.
(참고로, 군내에서 사적인 일기 작성은 금지되어 있다. 보안상..-_-)
역시, 제대한 이후 불규칙한 생활로 돌아간 나에게
일기란 건 다시 멀어져만 갔다.
싸이월드에 일기장이란 게 있어서 날마다 쓸 수는 있었지만
웬지 종이가 아닌 웹상에 펜이 아닌 키보드로 일기를 쓴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고 그래서 띄엄띄엄 부실한 내용으로 몇 번 쓰고는
집어치워버렸다.
이후 학교생활 내내 불규칙한 생활들이 이어지면서
일기를 쓸 시간 자체도 별로 없었거니와
(게임할 시간은 있어도-_-)
일기를 쓰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려
대학생활 내내 일기란 걸 전혀 쓰지 않았었다.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휴학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떨결에 1년이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래 일을 해 본건 처음이기에 일을 해가면서 차츰
일하는 곳에 대한 생각,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일 자체에 대한 생각들이 쌓여갔다.
그러던 중, 2007년 초 다이어리 판매 행사(일하는 곳이 대형 문구점이었다)가 끝나고
근사한 직장인용 다이어리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나야 일정관리 할 일은 전혀 없었기에
(그냥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놀다가 자는게 일상이었기에)
구석탱이에 처박아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저걸 한번 사용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한 페이지에 이틀을 쓸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분량도 적당하겠거니 해서
2007년 2월 18일부터 정말 제대로 된 장문(?)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뭐 역시 고등학교 때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쓸거리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코엑스에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기쓸 거리는 항상 무궁무진했다.
또한,
일기를 쓴 직후 평온했던 마음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고
그 후유증이 세달여간이나 지속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속시원히 털어놓기에는 너무도 술안주스러운 사건이었기에
나는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심란한 마음을
일기장에 풀어놓으며 다소나마 진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초반의 내용은 거의 그 사건에 대한 뒷처리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뭐, 어찌되었거나 일기장의 힘으로
후유증은 나름대로 수습될 수 있었고
그때와 맞춰 내가 일기를 건너뛰는 횟수도 늘어났다.
정말 처음 세 달간은 이틀 밀리는 일조차도 드물었다(술먹고 와서도 일기를 썼으니).
그러다가 마음이 평온해져서일까? 일기를 차츰차츰 밀리는 일이 잦아졌고
쓸거리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쓸거리가... 많은 시간 같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
어느새 그런 '소소한 여러 사건들'자체가 하나의 일상이 되어
일기거리로써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오기 며칠 전부터
다시 일기는 쓰지 않게 되어버렸다.
고작 1년 분량의 일기장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내가 일기란 걸 쓸 때는 '내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느낌으로 그걸 쓴다.
하지만, 결국 쓰다보면 내 삶에 대한 외형적인 기록이 아닌
그날그날 다른 누구에게 말해서 뱉어낼 수 없었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말들을 일기장 속의 '또 다른 나'에게 쏟아내는 형식이 되고 만다.
(저 60년전 안네가 '키티'라는 가상인격에게 가슴속의 말들을 쏟아 내었듯이)
그래서, 내가 일기를 쓰는 시기는 항상 나에게
어떤 것으로든 감성적인 정서가 풍부해지는 순간들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나름대로 1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야만 했었던 억압감? 같은 게 있었고
군대 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억압감과 상실감,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군생활에 대한
회의가 존재했었다.
일할 때는 뭐 시작은 그게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내 인생 최대의 심적 타격을 입고
그에 대한 끝없는 생각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다.
이제 내 인생에 또 일기를 쓰는 때가 올까? 라고 묻는다면
섣불리 '물론'이라고 대답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난 지금도 일기를 쓰고 싶고, 내 외형적인 모든 일들과 내 심적인 모든 변화들을
글로 남겨 '나의 역사'로 만들고 싶지만
힘들고, 애틋하고, 아련한 기억이 아니면
쉽게 그것을 날마다 글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나에게는
그런 힘들고, 애틋하고, 아련한 기억이 없을 것이라 믿고 싶고
설령 그런 기억이 다시 생겨난다 해도 이제는 그것을 내가 글로 남길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
(어렸을 때라 함은... 고등학교 때를 말한다-_-)
물론 초중딩 때 방학숙제로 내 주는 일기는 어김없이 밀려서
일기의 대부분을 시와 소설로 때우는 날림일기를 쓰곤 했지만
고등학교 때 손바닥만한 다이어리 붐이 불면서
거기다가 날마다 그날의 일상을 기록하는, 제대로 된 의미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었다.
사실. 손바닥만한 다이어리라는거 자체가 시커먼 남고딩보다는
여고딩들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이었던 데다가 거기다 일기를 쓰고
여러가지 잡스런 소리를 써 대며 '꾸민다'는 행위는 정말 남자고등학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딩때 쓰던 다이어리는
'남이 보면 안된다'는 일기장에 대한 불문률에도 불구하고
두루두루 돌려보며 즐기던(?)비운의 일기장이 되고 말았다.
그때 고등학생의 삶이란 게 워낙 단조로운 터라
지금 생각하면 무슨 쓸 말이 그리도 많았을꼬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각 수업 시간들마다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때 하던 풍물 동아리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작은 공간 안에 나름대로 알차게 적어 놓았었다.
(지금도 일기 부분은 가지고 있고, 가끔 서랍정리하다가 한번씩 꺼내 보곤 한다)
그때는 그래도 학교라는 틀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싫건 좋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일기를 쓰건 뭘 쓰건
'필기하는 행위'자체는 하루종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리 쓸 시간은 넘쳐났다.
야자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전혀 계획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학 1학년과 휴학생 생활을 보내고
군대에 가자 일기장 대신 '수양록'이란걸 줬다.
물론 지금에서야 수양록이 무슨 군내사고 발생시 수사자료로 활용된다느니 하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들어서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 잡지책만한 노트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에는 꽤나 반가웠었다.
물론 내 기대와는 달리 '일기'는 아니었고,
(수양록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2회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때처럼 쓸 시간이 풍부해서 날마다 그것만 쓰고 있을 수만도 없었다.
뭐 그래도 남들은 일병 되면 집어치운다는 수양록 작성을
병장 초기때까지 꾸준히 해 왔고
그것과는 별도로 집에서 보내온 작은 스케줄 수첩 같은 것에
정말 간단간단히 하루 일상을 적어보기도 했었다.
(참고로, 군내에서 사적인 일기 작성은 금지되어 있다. 보안상..-_-)
역시, 제대한 이후 불규칙한 생활로 돌아간 나에게
일기란 건 다시 멀어져만 갔다.
싸이월드에 일기장이란 게 있어서 날마다 쓸 수는 있었지만
웬지 종이가 아닌 웹상에 펜이 아닌 키보드로 일기를 쓴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고 그래서 띄엄띄엄 부실한 내용으로 몇 번 쓰고는
집어치워버렸다.
이후 학교생활 내내 불규칙한 생활들이 이어지면서
일기를 쓸 시간 자체도 별로 없었거니와
(게임할 시간은 있어도-_-)
일기를 쓰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려
대학생활 내내 일기란 걸 전혀 쓰지 않았었다.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휴학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떨결에 1년이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래 일을 해 본건 처음이기에 일을 해가면서 차츰
일하는 곳에 대한 생각,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일 자체에 대한 생각들이 쌓여갔다.
그러던 중, 2007년 초 다이어리 판매 행사(일하는 곳이 대형 문구점이었다)가 끝나고
근사한 직장인용 다이어리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나야 일정관리 할 일은 전혀 없었기에
(그냥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놀다가 자는게 일상이었기에)
구석탱이에 처박아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저걸 한번 사용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한 페이지에 이틀을 쓸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분량도 적당하겠거니 해서
2007년 2월 18일부터 정말 제대로 된 장문(?)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뭐 역시 고등학교 때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쓸거리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코엑스에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기쓸 거리는 항상 무궁무진했다.
또한,
일기를 쓴 직후 평온했던 마음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고
그 후유증이 세달여간이나 지속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속시원히 털어놓기에는 너무도 술안주스러운 사건이었기에
나는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심란한 마음을
일기장에 풀어놓으며 다소나마 진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초반의 내용은 거의 그 사건에 대한 뒷처리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뭐, 어찌되었거나 일기장의 힘으로
후유증은 나름대로 수습될 수 있었고
그때와 맞춰 내가 일기를 건너뛰는 횟수도 늘어났다.
정말 처음 세 달간은 이틀 밀리는 일조차도 드물었다(술먹고 와서도 일기를 썼으니).
그러다가 마음이 평온해져서일까? 일기를 차츰차츰 밀리는 일이 잦아졌고
쓸거리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쓸거리가... 많은 시간 같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
어느새 그런 '소소한 여러 사건들'자체가 하나의 일상이 되어
일기거리로써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오기 며칠 전부터
다시 일기는 쓰지 않게 되어버렸다.
고작 1년 분량의 일기장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내가 일기란 걸 쓸 때는 '내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느낌으로 그걸 쓴다.
하지만, 결국 쓰다보면 내 삶에 대한 외형적인 기록이 아닌
그날그날 다른 누구에게 말해서 뱉어낼 수 없었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말들을 일기장 속의 '또 다른 나'에게 쏟아내는 형식이 되고 만다.
(저 60년전 안네가 '키티'라는 가상인격에게 가슴속의 말들을 쏟아 내었듯이)
그래서, 내가 일기를 쓰는 시기는 항상 나에게
어떤 것으로든 감성적인 정서가 풍부해지는 순간들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나름대로 1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야만 했었던 억압감? 같은 게 있었고
군대 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억압감과 상실감,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군생활에 대한
회의가 존재했었다.
일할 때는 뭐 시작은 그게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내 인생 최대의 심적 타격을 입고
그에 대한 끝없는 생각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다.
이제 내 인생에 또 일기를 쓰는 때가 올까? 라고 묻는다면
섣불리 '물론'이라고 대답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난 지금도 일기를 쓰고 싶고, 내 외형적인 모든 일들과 내 심적인 모든 변화들을
글로 남겨 '나의 역사'로 만들고 싶지만
힘들고, 애틋하고, 아련한 기억이 아니면
쉽게 그것을 날마다 글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나에게는
그런 힘들고, 애틋하고, 아련한 기억이 없을 것이라 믿고 싶고
설령 그런 기억이 다시 생겨난다 해도 이제는 그것을 내가 글로 남길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
'SEASON 1 >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tand Alone (2) | 2009.08.30 |
|---|---|
| 자유에 대한 두려움, 취직에 대한 두려움 (1) | 2008.05.18 |
| Radio Generation (0) | 2007.10.18 |
| 군입대 전 나의 흔적 (0) | 2006.11.09 |
| 부끄러운 과거 (0) | 2006.06.04 |
posted by drunken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