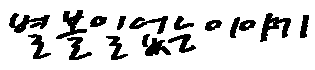"언제라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게 좋아."
"무슨 소리야? 완전히 사라진다니, 그게 대체..."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를 정도로,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그건 어느 술자리에서였다. 난 술이 얼큰하게 취한 채 술주정처럼 그 말을 내뱉었다. 물론 그 말을 심각하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술이 약한 한 사내의 술주정이려니 했다. 그도 그럴것이 멀쩡하게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준비라니.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 의미없는 술주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혹여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퇴직' 따위를 염두에 두었으리라.
하지만, 그 말을 내뱉은 바로 그 다음날. 난 정말로 사라졌다. 사실 난 술김에 그런 말을 내뱉은 건 아니었다(그런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는 다분히 술김에 저지른 짓이긴 했지만). 난 나름대로 사라질 준비를 해 오고 있었고, 마침 그 다음날이 내가 생각해 오던 그날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술에 취해 택시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간 그 다음날 아침.
난 확실히 사라졌다.
1.
오전 아홉 시. 출근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여느때라면 이미 회사에 도착해 의미없는 잡담을 지껄이거나 별볼일 없는 뉴스기사들을 클릭해가며 출근 직후의 졸음을 쫒고 있었을 테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 혼자뿐인 내 방 안에 있었고, 심지어는 출근길에 나서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침마다 내 단잠을 깨우던 알람들은 이미 무의식 중에 잠재워 놓은지 오래였고, 내 잠을 깨우기 위해 시간이 되면 저절로 켜지던 텔레비전도 오늘은 켜지지 않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내 잠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들 없이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누가 옆에 앉아 있다가 시간 맞춰 흔들어 깨운 것처럼, 나는 습관적으로 아홉시가 되자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습관적으로 일어난 나는 역시 습관적으로 침대 옆 책상에 놓여 있는 탁상시계를 집어들고서는 시간을 확인했다.
아.... 홉시?
나는 흠칫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치 오늘이 주말인 것처럼, 나는 시계를 확인하고서는 다시 잠을 청했다. 오늘은 평일이고, 아홉시에는 여기가 아닌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아홉시라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지나갔지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욕실로 달려갔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렇지 못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엔 확실한 기상의 의지를 가진 채로. 애벌레가 허물 밖으로 나오듯이 난 내 몸을 덮고 있던 이불을 꾸물꾸물거리며 벗어나 일어섰다. 아직 안경을 쓰지 않아서인지, 매일매일 지겹게 봐오던 내 방의 풍경이 망막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더듬더듬 책상을 뒤져 안경을 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광경은 선명해지지 않았다. 아직 잠이 덜 깬걸까. 나는 다시 안경을 벗고 세수를 하기 위해 싱크대로 걸어갔다. 싸구려 단칸방에는 세면대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종종 간단한 세면은 싱크대에서 해결하곤 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고 눈을 비볐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눈을 뜨자 그제서야 어렴풋이 방 안의 윤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력을 회복한 나는 책상 위 탁상시계로 눈을 돌렸다. 세수와 함께 시력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안경 없이는 흐릿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계 바늘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약간 찌푸려야 했다.
9시 26분.
출근 시간을 26분 넘긴 시간. 역시 '아차'하는 생각 따위는 들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연락도 없이 30분 가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누구한테서도 연락이 없다. 아침부터 바빠서 연락조차 할 시간이 없는건가? 관심이 없는건가? 잠깐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봤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말았다. 중요한 건 지금 시간은 9시 28분(생각하는 사이 2분이 지났다)이고, 난 이제 일어났으니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웃도리를 벗고, 입고 있던 바지를 걷어올렸다. 세면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옷이 물로 흠뻑 젖어버리고 만다. 나는 모내기하러 가는 농부의 모습을 하고 세면대가 없는 내 방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날이 제법 추워졌기 때문에, 아침에 샤워를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한 다음 드라이어를 꺼내어 머리를 말렸다.
욕실에서 나오면서 다시 시계를 보았다. 9시 38분. 역시 아무런 연락은 없고, 지각이 용인되는 마지노선인 9시 30분도 지났다. 하지만 역시 다급해진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나는 무덤덤하게 옷장을 열고 입고나갈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나는 옷장 안에 걸려있던 몇 벌 중에서 한 벌을 골라야만 했다. 약간 포멀한 느낌이 나는 검은색 셔츠에 진청색 청바지를 꺼내서 입었다. 양말을 꺼내 신고, 구석에 두었던 가방을 들어 어깨에 맸다. 어차피 어제 퇴근 이후 가방에서 꺼낸 물건이 없기 때문에 따로 물건을 챙길 필요 없이 그냥 들고 나가면 되었다. 이로써 출근 준비 완료. 세면을 위해 켜 놓았던 보일러를 끄고, 가스렌지 밸브를 확인한 후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방문 밖을 나서면 바로 바깥이다. 철컥. 열쇠를 돌리자 문이 잠겼고, 나는 열쇠를 다시 빼내어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손목에 채워진 시계는 이제 9시 45분을 지나고 있었다. 역시 아무런 연락은 오지 않았고, 나도 굳이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잊어버렸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posted by drunken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