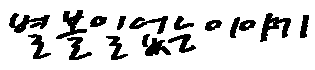오늘은 제 60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올해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뭐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그리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하루에 불과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와서야 '오늘이 원래 휴일이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휴일이 예전에 비해 참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휴일이란 걸 처음 적용받던 1988년, 그때의 휴일은
신정연휴 3일, 설연휴 3일, 3.1절,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연휴 3일,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총 20일에 달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1988년은 88올림픽 개최년도였기 때문에 9월 17일 올림픽 개막식날은 임시 공휴일이기도 했죠.
그때야 물론 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나이였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휴일들을 보냈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휴일이 주는 희열(?)을 알게 되면서
저 위에 열거된 날들은 언제나 기다려지는 날, 6일간 빡빡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얻는
보너스로 제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10월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죠. 국군의날(10월 1일)과 개천절(10월 3일)은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가운데 일요일이라도 낄라치면 자동 3일연휴가 되는 황금휴일이었고,
며칠만 기다리면 또 10월 9일 한글날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 대박은 바로 추석으로, 10월 초에 추석이 자리잡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연휴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학교를 가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다려지던 '보너스'가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군사독재가 끝나고 몇십년 만의 문민정부라던 김영삼 정부 시절,
문민정부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몇년 후, 한글날마저 공휴일에서 제외된 그냥 보통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몇몇 한글학자들이 반대하던 칼럼 같은 걸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제 유년시절에 '황금연휴'로 기억되던 10월의 연휴는 개천절 하나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무렵인가, 방학기간중의 휴일이라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던 신정연휴는
이중과세(二重過歲)란 어려운 명목 하에 달랑 당일 하루 쉬는 걸로 확 줄어 버렸습니다.
(이중과세 : 설을 음력 양력 두 번, 이중으로 센다고 해서 이중과세라고 불렀습니다)
이틀로 줄었다가 다시 하루로 줄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거나 지금은 하루밖에
쉬지 않으니까요.
몇년 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일상 속의 작은 보너스였던 국경일은 또 대량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나무심기 적당한 날씨가 바뀌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명목 하에
식목일이 작년부터 사라졌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주5일제로 휴일이 늘어서 법정 공휴일을 줄인다는 이유를 내세워
올해부터는 제헌절까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주5일제를 적용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1년에 52일이나 더 쉬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토요일까지 등교 혹은 출근을 해야 했던 예전보다 더 많이 쉬고 있는 것이죠.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없어져 가는 법정 공휴일이 확 늘어난 52일의 일상적인 휴일 이상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쉬어도 쉬어도 또 쉬고 싶은 게으른 저의 욕심인 걸까요.
보너스만 같던 법정 공휴일 대신 저에게 주어진 토요일 휴일은
휴일마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결코 없어져 버린 며칠의 아쉬움만큼의 기쁨으로는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다가, 등교하다가 주중에 자리잡은 국경일에 쉬는 기분은, 정기적으로 당연히 쉬는 날이 되어버린
토요일날 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없어져만 가는 법정 공휴일은 저를 너무너무너무 아쉽게 만듭니다.
주5일 해줬으니 좀더 나와서 일해라! 란 정부의 해명으로는 도저히 무마가 되지 않을 정도로요.
그냥, 하루라도 더 쉬고 싶은 게으른 자의 투정에 불과한 걸까요.
일상 속의 작은 보너스를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소박한 자의 한탄인 걸까요.
올해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뭐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그리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하루에 불과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와서야 '오늘이 원래 휴일이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휴일이 예전에 비해 참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휴일이란 걸 처음 적용받던 1988년, 그때의 휴일은
신정연휴 3일, 설연휴 3일, 3.1절,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연휴 3일,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총 20일에 달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1988년은 88올림픽 개최년도였기 때문에 9월 17일 올림픽 개막식날은 임시 공휴일이기도 했죠.
그때야 물론 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나이였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휴일들을 보냈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휴일이 주는 희열(?)을 알게 되면서
저 위에 열거된 날들은 언제나 기다려지는 날, 6일간 빡빡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얻는
보너스로 제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10월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죠. 국군의날(10월 1일)과 개천절(10월 3일)은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가운데 일요일이라도 낄라치면 자동 3일연휴가 되는 황금휴일이었고,
며칠만 기다리면 또 10월 9일 한글날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 대박은 바로 추석으로, 10월 초에 추석이 자리잡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연휴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학교를 가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다려지던 '보너스'가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군사독재가 끝나고 몇십년 만의 문민정부라던 김영삼 정부 시절,
문민정부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몇년 후, 한글날마저 공휴일에서 제외된 그냥 보통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몇몇 한글학자들이 반대하던 칼럼 같은 걸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제 유년시절에 '황금연휴'로 기억되던 10월의 연휴는 개천절 하나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무렵인가, 방학기간중의 휴일이라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던 신정연휴는
이중과세(二重過歲)란 어려운 명목 하에 달랑 당일 하루 쉬는 걸로 확 줄어 버렸습니다.
(이중과세 : 설을 음력 양력 두 번, 이중으로 센다고 해서 이중과세라고 불렀습니다)
이틀로 줄었다가 다시 하루로 줄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거나 지금은 하루밖에
쉬지 않으니까요.
몇년 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일상 속의 작은 보너스였던 국경일은 또 대량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나무심기 적당한 날씨가 바뀌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명목 하에
식목일이 작년부터 사라졌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주5일제로 휴일이 늘어서 법정 공휴일을 줄인다는 이유를 내세워
올해부터는 제헌절까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주5일제를 적용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1년에 52일이나 더 쉬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토요일까지 등교 혹은 출근을 해야 했던 예전보다 더 많이 쉬고 있는 것이죠.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없어져 가는 법정 공휴일이 확 늘어난 52일의 일상적인 휴일 이상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쉬어도 쉬어도 또 쉬고 싶은 게으른 저의 욕심인 걸까요.
보너스만 같던 법정 공휴일 대신 저에게 주어진 토요일 휴일은
휴일마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결코 없어져 버린 며칠의 아쉬움만큼의 기쁨으로는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다가, 등교하다가 주중에 자리잡은 국경일에 쉬는 기분은, 정기적으로 당연히 쉬는 날이 되어버린
토요일날 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없어져만 가는 법정 공휴일은 저를 너무너무너무 아쉽게 만듭니다.
주5일 해줬으니 좀더 나와서 일해라! 란 정부의 해명으로는 도저히 무마가 되지 않을 정도로요.
그냥, 하루라도 더 쉬고 싶은 게으른 자의 투정에 불과한 걸까요.
일상 속의 작은 보너스를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소박한 자의 한탄인 걸까요.
'SEASON 1 > 생활의 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글날, 인터넷의 얼굴들은? (2) | 2008.10.09 |
|---|---|
| 똥컴에선 불편한 RSS 전체공개 (2) | 2008.09.17 |
|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취인 여름간식! (4) | 2008.07.11 |
| 오늘은 3.1절입니다. 알고들 계신가요? (4) | 2008.03.01 |
| '존나'를 좀 없애보자 (4) | 2008.02.20 |
posted by drunkenstein